- 다문화가정 ‘우대’처럼 보인 장면, 교실에선 ‘표식’이 될 수 있다
- 지원은 필요하지만, 방식이 틀리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돌아온다
- 학교·교육청·지자체가 바꿔야 할 ‘낙인 없는 지원’ 설계

기자는 최근 학교 초등학교 학부모회의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 5명이 앞자리에 따로 앉아 햄버거를 제공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뒤쪽에 앉은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같은 간식이 제공되지 않았고, 시선과 표정의 온도차가 교실 밖 ‘지원’이 교실 안 ‘낙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학교 현장의 다문화 지원이 “차별을 막기 위한 배려”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달 방식에 따라 아이들의 일상에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회의에 참석한 다문화가정의 학생 아버지는 기자를 만나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햄버거를 조금 먹고 있는데, 뒤에 계신 학부모님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같은 한국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기자가 본 장면의 핵심은 ‘무엇을 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줬느냐’에 있다. 지원은 늘 ‘대상’을 특정한다. 문제는 그 특정이 공개적·가시적 방식으로 이뤄질 때, 지원이 곧바로 ‘표식’이 된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앞자리’로 분리 배치하고, 간식을 ‘그들만’ 받는 형태로 제공한 순간, 학교는 의도와 무관하게 “저분들은 특별한 분들(혹은 다른 분들)”이라는 메시지를 공간과 행동으로 공표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전형적인 낙인(stigma)의 메커니즘이다. 낙인은 사람의 의도보다 ‘구조’가 만든다. 공개적 분리(좌석) + 차등 제공(간식) + 주변의 시선(표정)이라는 3요소가 결합하면, 배려의 언어는 쉽게 ‘특혜’ 혹은 ‘구분’의 언어로 번역된다. 그리고 그 번역의 비용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치른다. 방학이 끝나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학부모회의 장면이 어떤 방식으로든 소문과 뉘앙스로 확산되면 아이들은 “우리 집은 다르다” “우리 엄마(아빠)는 특별대상이다” 같은 불편한 라벨을 교실에서 마주할 수 있다.
법과 정책의 기본 원칙은 이미 분명하다.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은 인종 등 사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역시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존중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원은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지원이 ‘차별’이나 ‘낙인’으로 읽히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종종 “다문화가정이 오기 어렵다”,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앞자리로 모셨다”, “챙겨드리려다 보니 그분들께 먼저 드렸다” 같은 선의가 작동한다. 그러나 선의는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는 아이들의 ‘관계의 생태계’를 운영하는 곳이다. 학부모회의의 작은 연출은 곧바로 학급 안의 미세한 위계와 거리감으로 옮겨갈 수 있다. “배려의 노출”이 커질수록, ‘차이’의 강조도 커진다.
그렇다면 교육적·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핵심은 (1) 보편 제공 + (2) 필요 지원의 비식별화 + (3) 관계 설계다.
첫째, 행사·회의에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보편 제공이 기본이어야 한다. 간식, 안내물, 기념품처럼 상징성이 있는 물품은 ‘누구나 받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오늘은 다과 없이 진행합니다”가 차등 제공보다 낫다. 작은 비용 절감이 큰 사회적 비용(갈등·상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식별(낙인 최소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 지원, 안내문 다국어 제공, 상담·연계는 ‘특정인을 앞에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 이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QR로 통역 요청, 별도 상담창구의 예약제, 전체 학부모에게 동일한 안내문을 배포하되 다국어 버전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특정 집단만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어떤 이에게는 더 유용한 장치”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학교는 ‘좌석’과 ‘호명’ 같은 상징 장치에 대한 내부 가이드가 필요하다. 앞자리는 공로자나 대상자를 “세우는” 자리로 기능하기 쉽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한 덩어리로 앞에 앉히는 대신, 희망 좌석을 자율로 두거나, 안내·진행을 돕는 역할자(학부모 임원, 통역 봉사자 등)만 앞에 앉히되 그 역할이 공개적으로 설명되도록 하는 편이 낙인을 줄인다.
사회분석 기반 정책 제안: “낙인 없는 다문화 지원” 체크리스트
아래 제안은 학교 단위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것부터 교육청·지자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것까지 포함한다.
1) 학교 운영 지침(즉시 실행)
보편 제공 원칙: 간식·기념품·선물은 전원 동일 제공(또는 미제공)
대상 특정 금지: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나오세요/앞자리에 앉으세요” 같은 공개적 특정 지양
지원의 ‘선택권’ 부여: 통역·상담·학습 안내는 ‘원하면 신청’ 방식으로 전환
다국어 기본 탑재: 안내문·가정통신문은 최소 2~3개 언어 병기(필요시 QR 링크)
민감도 교육: 교직원·학부모회 임원 대상 ‘낙인 최소화 커뮤니케이션’ 연 1회 의무화
2) 교육청 정책(구조 개선)
학교행사 차별·낙인 예방 매뉴얼을 교육청 공통 지침으로 배포(사례 중심)
통·번역 인력 풀(pool) 운영: 학교가 ‘특정 학부모를 앞세우지’ 않아도 지원이 작동하도록
민원·갈등 조정 라인: 다문화 이슈를 생활지도 차원이 아닌 인권·교육권 관점에서 중재
‘보편+선택’ 예산 설계: 전원 제공 항목(기본) + 필요 기반 항목(선택, 비식별)을 분리 편성
3) 지자체·지역사회 연계(생활 지원)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다. 이런 사업이 학교 안에서 ‘표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지자체 프로그램을 학교 밖 안전한 공간(가족센터 등)과 더 촘촘히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족센터 원스톱 연계: 학교는 안내·연결 역할, 서비스는 외부 전문기관이 담당
학부모 네트워크 ‘혼합형’ 운영: 다문화/비다문화 분리 모임이 아니라 관심사(학습·돌봄·진로) 기반 혼합 모임으로 전환
아동 중심 심리지원: ‘차별 경험’이 의심될 때 즉시 상담·회복 프로그램 연계
4) 권리 구제와 예방(인권 관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한다. 학교 현장에서 차별 또는 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운영이 반복된다면, 교육청 차원의 조사·재발방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인권기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열려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 설계다. 학교가 ‘선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정책의 역할이다.
이 사건은 한 학교의 작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다문화 지원이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배려→낙인으로 뒤집힐 수 있는지 보여준다. 교육은 차별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장치여야 한다. 그러려면 지원의 존재를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지원이 ‘드러나는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학교는 ‘선의’가 아니라 ‘구조’로 안전을 만들어야 한다.
강물아 기자 (심리상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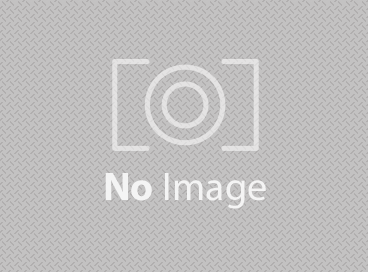 AI 혁신 물결: xAI의 세계 모델, OpenAI GPT-5 업데이트, Hugging Face 오픈소스 NLP 모델 출시
2025년 말, AI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의 연이은 발표가 이어지며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xAI의 로보틱스용 물리 세계 이해 모델 개발, OpenAI의 GPT-5 시리즈 업데이트, 그리고 Hugging Face의 맞춤형 NLP 오픈소스 모델 출시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발전은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적 적용을 촉진할 ...
AI 혁신 물결: xAI의 세계 모델, OpenAI GPT-5 업데이트, Hugging Face 오픈소스 NLP 모델 출시
2025년 말, AI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의 연이은 발표가 이어지며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xAI의 로보틱스용 물리 세계 이해 모델 개발, OpenAI의 GPT-5 시리즈 업데이트, 그리고 Hugging Face의 맞춤형 NLP 오픈소스 모델 출시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발전은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적 적용을 촉진할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 코엑스서 예술과 기업의 만남 성황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 코엑스서 예술과 기업의 만남 성황
 [손현식 칼럼] 270만 외국인 시대, ‘함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손현식 칼럼] 270만 외국인 시대, ‘함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할리우드 배우노조, 스튜디오 측에 새 반대 제안 테이블에 올리다
할리우드 배우노조, 스튜디오 측에 새 반대 제안 테이블에 올리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된 사랑… 특별한 결혼의 여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된 사랑… 특별한 결혼의 여정

 목록
목록










